한설희 교수님을 뵙고 1부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한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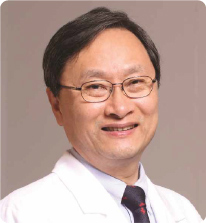
이번 호 “뵙고 싶었습니다” 코너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치매학회 초대 회장이셨던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90년대 초반부터 치매 분야를 연구하셨고 2002년 대한치매학회를 창립한 이후 10여년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서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이번 호에는 대한치매학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주로 진행하고 다음 호에는 교수님의 삶과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 드릴 예정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편집장 :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학회 소식지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한설희 교수님 :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뷰를 약속한 이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소 일정이 늦추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 사실 교수님을 모시고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교수님께서 치매 분야를 전공으로 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로 치매라는 개념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치매 분야를 택하셨고 이 부분을 개척해나가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설희 교수님 :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서 치매 분야를 개척해 나간 것은 아니고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과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매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인 199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에서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재일교포였던 대학 동기 중에서 일본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의 초청으로 동경 교외에 위치한 일본 ‘국립정신-신경센터 (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NCNP)’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퇴행성 신경질환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말이 국제 컨퍼런스이지 연자로 초청된 4-5명의 미국 신경과학자들과 청중석에 있는 제가 외국참가자 전부였습니다. 당시 NCNP의 제 6내과 과장이셨던 Takeshi Tabira 선생을 처음 만났고 컨퍼런스 후 일본 후생성이 주관한 만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Tabira 선생은 다발성경화증의 최고 전문가중 한 사람 이었고 아마 치매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Tabira 선생의 소개로 일본의 치매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치매가 벌써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 한국도 미리 고령사회와 그에 따르는 치매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치매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무작정 그들의 견해가 옳은 것 같아 치매 분야 공부를 시작 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편집장 :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는데요. 막상 치매를 연구해보시기로 결정 하셨어도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설희 교수님 : 연수를 치매 분야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 도서관 에서 ‘Green journal(Neurology)’ 몇 년치를 뒤져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그룹이 John Morris 교수가 속해있던 Washington University at St. Louis 라는 것을 알았고 John Morris 선생의 mentor인 Leonard Berg(CDR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분이고 2007년 뇌졸중으로 80세를 일기로 작고)에게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편지를 냈습니다. 당시는 e-mail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Berg 교수가 자기 제자였던 Joh Morris와 접촉해보라는 답이 왔습니다. 지금은 치매학회 선배들이 도와 주어서 외국 연수를 위해 해당 교수와 접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John Morris 교수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때였으므로 쉽게 답을 안주고 우선 6개월간만 근무해보고 자기가 판단하여 연수기간 연장을 결정해주겠다는 깐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Duke 대학에서 epilepsy fellow로 근무하던 대학 후배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Duke Alzheimer’s Disease Research Center(ADRC)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할 project 가 꽤 많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Duke 의대 교수로 근무하던 신철수 교수(나중에 Mayo Clinic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Duke 대학의 한설희 교수님 mentor인 Donald Schmechel과 관계가 돈독하심)를 학회에서 만났는데 “기왕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미 떠 있는 별 밑에서 일하기 보다는 이제 떠오르는 별을 찾아 공부를 배우는 것이 낫다”라는 결정적인 훈수를 주었습니다. 그 분의 도움으로 급히 방향을 수정하여 Duke 대학으로 연수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도 당연시 되는 개념이지만 당시 Duke 대학에서 APOE genotype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Duke ADRC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피펫을 잡아 보았으니 무모한 도전이기는 하였으나 모든 것이 새롭고 하나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3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기초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실험기법들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당시 APOE와 알츠하이머병과의 관련성에 관해 처음 학회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연관된 유전자가 어떻게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논란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치매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과정에 함께 했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편집장 : 아까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함께 하신 분들은 누구신지요?
한설희 교수님 : 제가 Duke 대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즈음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서 병리과에서 성주호 교수에게 사사했던 이대 병원 최경규 교수, 현재 심평원 근무중인 양기화 교수, 그리고 Heilman 교수에게 사사한 삼성 서울 병원의 나덕렬 교수, 정신과 전문의 이면서 미국에서 치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효자병원 한일우 원장 등 치매 연구에 관심이 높았던 소수의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치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차제에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치매에 관해 공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것이 치매연구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 가톨릭 의대 김범생 교수, 양동원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가 합류하면서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주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치매 환자 case를 함께 공부하는 형식이었죠. 참여 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1996년 본격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구회 인원이 30-50명이 되면서 2002년 대한치매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장 : 창립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설희 교수님 : 사실 학회를 창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회 인원이 늘면서 점차 학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신과에서 학회 경험이 많았던 한일우 원장이 앞장서서 실무적인 일들을 진행해주면서 점점 가시화되었지요. 일부 신경과 외부 노교수님들이 막상 학회가 창립되는 분위기에서 여러 압력과 간섭이 있었지만 연구회 회원들의 지지 속에 제가 초대 회장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장 : 그 이후 10년 넘게 학회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설희 교수님 : 우선 치매 교과서 편찬을 우선 들고 싶습니다.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저자가 되어 양질의 한글 교과서를 편찬한 점은 매우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를 오병훈 교수가 이끌 때 열린 자세로 치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치매진료지침 마련, 치매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을 해온 점도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두 학회가 서로 반목을 하게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초창기 학회 예산을 절감하면서 서초동에 학회 사무실을 마련한 점도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국제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정보 공유의 기회를, 해외학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에게는 정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wrap up 미팅을 시작하였는데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환갑일 때 John Morris, Bruce Miller. Mony de Leon, James Galvin 과 같은 세계적인 치매연구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쪼개어 3박4일의 무리한 일정에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낸 점은 모든 분들께 아직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장 : 말씀 나오신 김에 해외 전문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치매학회 교수님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이 가능했을까요?
한설희 교수님 :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영어로 해외 연자 들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해외 학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강의 끝나고 꼭 만나서 강의를 부탁 드리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낯설어 하던 분들도 한 번 방문하면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환대와 학문에 대한 열의에 감동해서 우리 학회와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관계가 밀접해졌고 특히 그 이후 연수를 가게 된 학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주면서 더더욱 이미지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봅니다.
편집장 : 치매학회의 설립 과정과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저 같은 후배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치매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설희 교수님 : 우선 치매 관련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회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부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아쉽게도 정책관련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정신과 연구 그룹이 노력해온 부분이기에 쉽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회가 좀 더 이 부분에 역량을 키워야 하고 학회 회원 중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하는 회원이 나왔으면 합니다. 모두들 학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학술적인 것도 하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고 이 분야만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회 회원들의 관심분야가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neuro-imaging과 신경심리검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더 basic research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기초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장 : 네 학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쭈어 볼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AlzAha 웹진 4호에 이어서 연재됩니다.